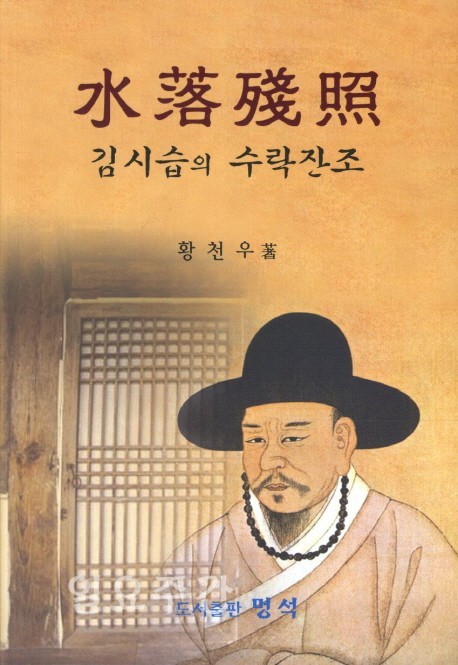
수락잔조 (水落殘照)
水落殘照
수락산 노을
한 점 두 점 물들어가는 저녁노을
서너 마리 외로운 집오리 둥지로 돌아가네
높은 봉우리 산허리엔 그림자 드리우고
수락산은 푸른 이끼 낀 물가 드러내네
날아가는 기러기 낮게 돌며 떠나지 못하고
둥지로 돌아오던 갈가마귀 다시 놀라 날아가네
하늘 끝 다함없으니 어찌 생각에 한계 있으랴
붉은 빛 드리워진 그림자 맑은 빛에 흔들리네
一點二點落霞外(일점이점낙하외)
三?四?孤鶩歸(삼개사개고목귀)
峯高剩見半山影(봉고잉견반산영)
水落欲露靑苔磯(수락욕로청태기)
去雁低回不能度(거안저회불능도)
寒鴉欲棲還驚飛(한아욕서환경비)
天涯極目意何限(천외극목의하한)
斂紅倒景搖晴暉(염홍도경요청휘)
“날이 찬데 밖에서 뭐하시오?”
해질 무렵 수락산을 바라보며 시 한 수 짓고 있는데 이 진사가 술병과 음식을 싼 보따리를 손수 들고 찾아왔다.
“지체 높으신 양반이 이 시간에 어인 일이오?”
“천하의 대 스님께 세상살이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왔습지요.”
“천하의 대 스님이라.”
시습이 중얼거리며 앞에 놓인 붓과 종이를 한쪽으로 밀치고 이 진사의 손에 들려 있는 술병과 보따리를 쳐다보았다.
“배움에는 공짜가 없다기에 약소하지만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경우는 바르오. 여하튼 올라오시오.”
마루에 올라선 이 진사가 시습이 한쪽으로 밀쳐낸 종이를 유심히 살폈다. 그리고는 수락산과 시습이 쓴 시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역시 명성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조선 최고의 천재라는 명성 말입니다. 스님의 문장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과연 명불허전이오.”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시오.”
“아닙니다. 보통사람들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보지 못하는 것을 스님께서는 절묘하게 찾아내어 들추시지 않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렇게 말하니 내 몸 둘 바 모르겠소이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놔둘 참이오?”
시습이 눈짓으로 술병과 보따리를 가리켰다. 그 의미를 알아 챈 이 진사가 보따리를 푸는 동안 시습은 일어나 술잔과 수저를 챙겨 돌아왔다. 음식들을 보니 이 진사의 정성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었소이다.”
이 진사가 술을 따르자 시습이 은근한 입담으로 분위기를 돋우었다.
“제 잘못이 컸지요.”
“아니오. 그래도 이 진사는 자신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지 않았소. 미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내 불찰이었소.”
시습 역시 정중하게 이 진사의 잔을 채웠다.
“자, 지난 시간은 훌훌 털어버립시다.”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단번에 잔을 비워냈다.
“요사이 노원에 스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합니다.”
“소문이라니요?”
“저와의 일도 그렇지만 한명회 대감에게 치도곤을 놓았다는 소문이지요.”
“한명회에게 치도곤 놓았다!”
실없이 코웃음을 지었다.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소문이란…… 어쨌든 이 진사, 한명회가 내게 치도곤당할 사람이오?”
“그러면요?”
“그 사람의 정자에 붓으로 장난 좀 쳤을 뿐이오.”
이어 압구정에서 있었던 일을 곁들였다. 말없이 듣고만 있던 이 진사가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호탕하게 웃어 젖혔다.
“치도곤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치도곤이야 그때뿐이지만 스님께서 하신 일은 그 사람의 생과 명성 전체를 흔들고 뒤바꾸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술을 따르는 이 진사의 표정이 냉담해졌다.
“그런데 스님. 저야 아무런 힘도 없지만 한명회 대감은……”
“힘은 무슨. 그리고 그런 곳에 정자까지 짓고 지낼 정도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빤한 거 아니겠소. 막말로 이 진사가 상납한 뇌물이 어디로 가는지 말이오.”
순간 이 진사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 모습을 보자 고뇌의 정도를 알 듯했다.
“수차례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그러면 그 놈들이 요구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그거지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 무슨 날만 되면 은근히 그 사실을 알려오고 말이오. 그 알량한 권세가 무섭소, 무서워. 그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른 체할 수 없으니 어쩌겠소.”
시습이 술을 털어 넣듯 잔을 비우고는 깨질듯이 움켜쥐었다.
“더 웃긴 일은 무언지 아십니까?”
“무엇이오?”
“우리 같은 놈들은 우리가 바치는 뇌물을 털어 넣는 당사자의 코빼기조차도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오?”
“거간꾼이지요.”
“거간꾼이라니요?”
“일종의 다리지요. 중간에 있는 놈들에게 물건을 상납하면 그 놈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그것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시습이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놓고는 이 진사와 자신의 잔에 술을 따랐다. 시습의 손이 심하게 흔들렸다.
“그 놈들에게 들어가는 뇌물도 만만치 않겠구려.”
“상황이 그러하니 얼마나 제대로 전달되겠소. 빤하지요.”
“허허, 결국 이래저래 먹이사슬 맨 밑에 있는 백성들만 죽어나게 되는구려.”
“그렇지요. 해서 나도 이참에 고리를 끊으려합니다.”
“끊다니요?”
“그 알량한 권세 포기하고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서서 살겠다는 말이지요.”
잠시 이 진사를 빤히 쳐다보던 시습이 자세를 바로잡고 정중하게 합장했다.
“성불하셨소. 진심으로 축하드리오.”
“그러지 마시오. 부끄럽습니다.”
“사람이란 말이오.”이 진사의 환한 얼굴을 보며 잠시 숨을 고른 시습이 나직이 말을 이었다.
“사람이란 말이오, 모순되고 결점 많고 완벽하지 못하기에 사람인 게요. 그렇지 않다면 신이지요.”
“저를 위로하려는 말씀입니까?”
“위로가 아니라 사실을 규명하는 이야기요.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결코 신이 될 수 없다오. 또 사유하고 서로 협력해야 살 수 있기에 인간은 동물처럼 살 수도 없소. 그럼에도 어리석고 악한 자들은 신을 흉내 내고 사람 위에 군림하려 들지요. 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일이요.”
시습이 잠시 말을 멈추고 잔을 기울였다.
“모순이지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극복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모순에 굴복하기를 거침없이 하니 세상이 요지경이 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신의 본질마저도 퇴색시키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지요.”
“부처님도 신이지 않습니까?”
“신이라면 신이고 사람이라면 사람이지요. 중요한 사실은 종교란 그저 빌고 매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오. 부처님을 따르는 불교만 해도 그렇소. 불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라기보다 깨달음을 강조하는 철학이라 함이 합당할 거요. 자신의 내면세계와 보이는 세상에 대한 참과 상관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변화시켜가는 깨달음 말이오.”
연방 고개를 주억거리던 이 진사가 한순간 눈을 반짝였다.
“스님!”
“말씀하세요.”
“이왕 노원에 터를 잡으셨으니 이곳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도 가르침을 주시면 어떠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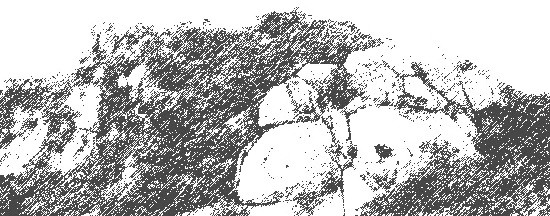
시습이 손사래를 쳤다.
“아니 되겠습니까?”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회의 치명적인 문제는 백성들에게 있지 않다는 뜻이라오.”
이 진사가 사회의 치명적인 문제를 되뇌더니 침묵했다.
“나라의 중심부 즉 조정의 핵심부터 썩어 있어 백성의 삶이 고단한데 백성들만 붙들고 가르친다면 무슨 소용이며 해결책이 되겠소.”
“하면?”
“큰 쥐를 잡아야지요, 큰 쥐!”
쥐라는 소리에 이 진사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갔다.
“아아, 이 진사를 지칭하는 게 아니오.”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왠지 찔립니다.”
시습이 얼른 다가앉아 이 진사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 큰 쥐를 잡을 일입니다.”
큰 쥐를 잡아라
동장군이 떠난 천지에 다시 생동감이 넘쳤다. 겨우 내내 이 진사는 수시로 시습을 찾아와 동무했다. 술을 나누며 오간 정감이 채 굳어지지도 않았는데, 시간은 유수처럼 흘러 어느새 수락산 곳곳에 새싹이 돋고 있었다.
따스한 봄 어느 날 시습이 서둘러 길을 나섰다. 파릇파릇 풀빛 짙어지는 노원의 들길을 걷자니 절로 시심이 솟구쳤다.
蘆原草色
노원의 풀빛
긴 제방의 가는 풀들 어찌 그리 삼삼한지
무성한 곳에 바람 일면 향기 또한 그윽하여라
강엄이 이별했던 포구 색보다 더욱 푸른데
이태백이 한강 굽어본다면 무슨 생각할까
풀 수북한 언덕 위에 누런 송아지 누워있고
초목 우거진 다리 가에 푸른 아지랑이 피어오르네
왕손의 하 많은 한 얼마나 넘쳐날까
뿌연 연기 성긴 비에 강남이 생각나네
長堤細草何??(장제세초하삼삼)
??風際香??(처처풍제향암암)
江淹別浦色愈碧(강엄별포색유벽)
李白漢曲思何堪(이백한곡사하감)
蒙茸壟上沒黃犢(몽용롱상몰황독)
蔥?橋邊含翠嵐(총천교변함취람)
惹得王孫多少恨(야득왕손다소한)
淡煙疏雨懷江南(담연소우회강남)
시샘이 열어주는 대로 중얼거리며 걷다보니 어느새 중랑포였다. 정신을 가다듬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한 사람이 다가왔다.
“스님, 겨우내 잘 지내셨습니까?”
고개 돌려 바라보니 지난 가을 노량원에 함께 갔던 그 뱃사공이었다.
“그대도 별고 없었소? 날이 참으로 좋소이다.”
“오늘은 어디로 가실 겁니까요?”
시습의 행색을 살피고난 뱃사공이 은근하게 물었다.
“오랜만에 한양에 들어가 술이나 한잔하려 하오.”
“그러면 석교로 건네 드리면 되겠네요?”
뱃사공의 표정과 말투가 유난히 살가웠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소?”“스님, 아십니까? 노원의 양반들이 변하고 있습니다요.”
“변하다니요?”
“상계에 사는 이 진사를 중심으로 대다수의 지주들이 올해부터는 소작인들에게 고리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요.”
“그것 참 고마운 일이구려.”
“모두 스님 덕분입니다요.”
이 진사의 얼굴을 떠올리니 실없이 자꾸 웃음이 났다.
“그럼 오늘 뱃삯은 공짜렷다!”
“두 말하면 잔소리지요. 스님은 언제고 공짜로 모시겠습니다요.”
공짜라는 말에 힘주어 말하는 뱃사공의 수수한 마음에 공손히 합장하고는 배에 올랐다. 날이 맑아서인지 석교가 더 선명하게 보였다. 저 석교를 지나 달려가면 단숨에 이를 듯 반궁(명륜동)이 가깝게 느껴졌다.
“스님, 어디를 바라보시는 겁니까?”
“내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 바로 반궁이라오. 오늘은 그곳에 들러볼 참입니다.”
“아직도 친구 분들이 살고 계신가봅니다?”
잠잠히 옛 추억을 떠올리며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려보았다. 그러고 보니 어린 시절 단짝 친구였던 안신을 본지도 한참 되었다 싶었다.
“오늘 돌아오시는지요?”
뱃사공의 말에 고개를 드니 어느새 배가 석교 선착장에 도착해있었다.
“모르겠소. 어디에도 매이지 않은 몸이니 오늘이면 어떻고 내일이면 어떻겠소. 늦어지면 내일 오리다. 오랜만에 친구 집에서 신세 좀 지지요.”
뱃사공의 배웅을 받으며 배에서 내려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석관(석관동)을 지나 점심 무렵쯤 돼서야 반궁초입에 도착했다. 반궁에 들어서자 어린 시절의 추억이 샘솟듯 솟구쳤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지만 추억만큼은 늘 더디 흘렀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태어나고 자란 집을 살펴보다 이내 안신의 집으로 향했다.
 | ||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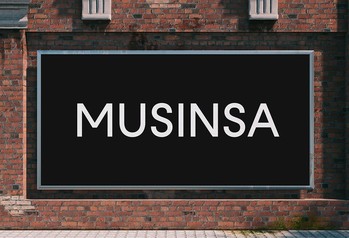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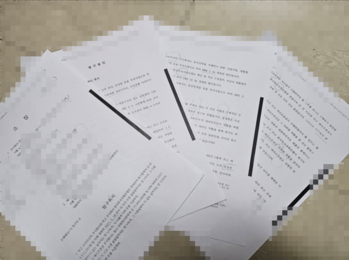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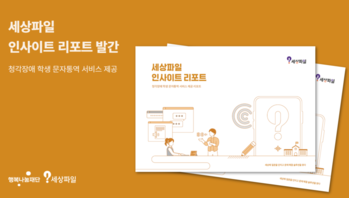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