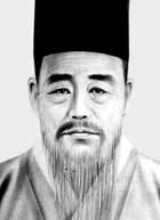 | ||
| ▲ 의병장 김도현 선생 | ||
2014년 새해가 밝았다. 세월은 흐르지만 역사는 살아 오늘도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먼저 세대를 산 선조들의 의무는 올바른 역사를 잘 간직해서 후대에 전해주는 일이다.
더 나아가 일제 치하에서의 수치스런 삶에 굴하지 않고,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노력했던 독립 운동가를 재조명하여,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 어린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굳은 정신을 가진 조상들의 임무라 생각한다. 이달의 독립운동가 의병장 김도현의 이야기다.
벽산(碧山) 김도현(金道鉉)은 1852년 경상북도 영양군 청초면 소청리(지금의 청기면 상청리)의 비교적 풍요했던 집안에서 태어나 유교적 가르침 속에서 성장했다. 그가 의병전쟁에 함께 몸을 담근 것은, 44세가 되던 1896년 1월의 일이었다.
김도현 선생은 영양읍에서 통문을 돌리고 영양지역 유생들과 의병 일으킬 일을 논의했으며, 이듬해 2월 청량산에서 의병진용을 편성해 무기를 조달하고 의병을 모집했다. 의병부대의 통합을 시도해 자신의 부대를 예안의 의병부대인 선성의진에 합류시켜 중군장을 맡게 됐고, 경북지역 7개 의병부대의 대표들과 함께 회맹의식을 갖고 승리를 기원했다.
1896년 3월 연합의진은 상주 태봉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병참부대를 공격해 상당한 전과를 거뒀고, 6월에는 민용호가 이끌던 강릉의진과 연합해 강릉 대공산성, 보현산성 및 삼척전투에서 관군에 대항해 전투를 벌였다.
이후 선생은 선유어사(宣諭御使)의 권유를 받고 1896년 10월 15일 전기의병에서 마지막으로 의병부대를 해산했다. 김도현 선생은 ‘벽산선생 창의전말’(碧山先生倡義顚末)이라는 의병기록을 남겨 의병운동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이후 세대가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되고 외교권이 박탈되자, 선생은 을사 5적의 처단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또한 여러 나라 공사관에 보낸 ‘포고서양각국문(布告西洋各國文)’은 만국공법에 맞추어 우리나라를 일제의 횡포에서 구해 달라고 호소문이었다.
이어 1906년 1월, 김도현선생은 목숨을 다해 다시 한 번 투쟁할 것을 각오하고 포군 5~60명을 축으로 의병을 일으켰으며, 광무황제의 밀칙을 받고 삼남지역의 각 군에 ‘의격고삼남각군문’(擬檄告三南各郡文) 등을 보내어 의병 궐기를 촉구했다.
김도현은 의병을 이끌고 영양군 관아를 찾아갔다. 그는 영양군수 이범철(李範喆)에게 자신이 상소투쟁을 펼치려고 서울을 다녀온 이야기를 하며, 그곳에서 죽으려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면서 통탄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김도현은 “지금 도둑 신하 무리들이 권력을 희롱하여 차마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병사를 일으켜 분함을 갚고자 하노라”고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나 영양군수 이범철은 김도현의 뜻과는 달리, 그를 설득하여 의병을 해산시킬 수 없음을 판단하고 안동에 군대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14일자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에는 이범철 군수의 요청에 따라, 안동에서 진위대와 일본군이 몰려들어 김도현의 가족 6~7명을 묶고, 집 부근 동네에서 소 20여 마리와 재물 등을 약탈하였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영양군수 이범철은 김도현이 5읍도집강으로 있을 때 ‘결납전’(結納錢)을 거두어 의병의 군비로 쓰고자 했다는 죄목으로 체포하려 들면서, 안동진위대와 일본군을 보내 오히려 약탈한 것이다. 그러므로 김도현선생과 집안 식구들의 고초와 재산의 침략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고향인 소청동 일대가 안동진위대의 약탈과 폭력으로 아비규환이 되었다. 참혹한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도 붙잡혀 혹독한 날을 보냈다. 이러한 소식이 신문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는 바람에 이범철 군수의 탐학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
마침 광무황제가 김도현 선생에게 의병을 일으키라는 밀칙, 곧 비밀 명령을 보내왔다고 알려진다. 그러나 그로서는 다시 의병을 일으킬만한 여유가 없었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상황인데다가 관군과 일본군이 그의 움직임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무력항전 극복…계몽운동과 애국심 함양
일본과 몸으로 싸우는 무력항전에 한계가 있음을 깨달은 김도현 선생은, 계몽운동과 애국심을 키우는 교육에 힘쓰게 된다. 마침 1909년 5월말 영양읍내에 설립된 신교육 기관인 영흥학교는 계몽운동의 거점이었다.
김도현은 교육회장을 맡아 군수 윤필오의 도움을 받아 기본금을 적립했다. 그리고 학생들을 모집하여 학습에 힘쓰도록 힘을 기울였다. 그 뒤 이 학교는 같은 해 11월 1일 영양군 객사를 수리하여 교사(校舍)로 사용하였고, 학부의 인가를 받아 개교하여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김도현이 1896년 예안의 선성의진의 중군장으로 활약하면서 스승으로 맺은 이만도선생은 안동 도산면 하계마을 사람이다. 그는 일찍이 예안에서 선성의진을 조직하여 의병장을 지낸 인물이자, 1905년에는 을사오적을 목 베라고 상소투쟁을 펼쳤을 뿐 아니라, 1910년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정순국(自靖殉國)을 길을 택한 사람이다.
이만도는 1910년 9월 음식을 끊고 자결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그가 ‘자정순국’(自靖殉國)을 선택한 명분은 황제와 의리 지키기, 나라와 의리 지키기, 겨레와 의리 지키기였다. 이만도는 단식 기간 동안 찾아온 친구들과는 인생을 담론했고 제자들에게는 경학을 강의하며, 집안 아랫사람들에게는 살아가는 바른 길을 가르쳤다.
김도현 선생도 이 자리에서 살아갈 바른 길과 방법을 뼈저리게 배웠다. 단식을 말리러 갔던 길에서 그가 본 것은 목숨을 건 스승의 저항의지요 바른 길을 택하여 나아가는 곧은 자세였다.
이에 김도현은 스승에게 자신도 순국의 길을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스승은 “자네는 어른이 살아 계시지 않은가?”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도현은 ‘뒷날’ 따라 가겠다고 말씀을 올렸다. 스승이 앞서고 제자는 뒷날 그 뒤를 따르겠다는 다짐이었다.
나라를 잃은 망국의 설움을 어찌할 수 없어, 곡기를 끊고 이만도선생은 10월 15일 순국하였다. 바로 그날부터 집안 조카 이중언도 단식을 시작하여 27일 만에 순국하였고, 함께 나라를 위해 애쓰던 이현섭· 이면주· 류도발· 권용하· 김택진 등이 장엄한 순국의 대열을 이어갔다.
그 대열을 지켜보는 김도현은 먼저 가신 스승에게 제문을 올리고 영흥학교를 열심히 키우며 슬픔의 날을 보냈다. 그러나 1914년 음력 7월 존경하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다. 나라와 아버지와 스승을 잃은 김도현 선생은 ‘동포들에게 드리는 글’(與國內同胞)과 절명시를 남기고, ‘치명수지’(致命遂志)의 길을 선택하였다.
그는 바닷가에 우뚝 자리를 잡은 산수암(汕水巖)에 올라 유시를 지었으며, 장손 여래와 삼종제(8촌 동생) 태현에게 큰 소리로 읽으라고 일렀다.
我生五百末(조선왕조 오백 년 끝자락에 태어나), 赤血滿腔腸(붉은 피 온 간장에 엉키었구나) 中間十九載(중년의 의병 투쟁 19년에), 鬚髮老秋霜(모발만 늙어 서리 끼었는데), 國亡淚未已(나라가 망하니 눈물이 하염없고), 親歿心更傷(어버이 여의니 마음도 아프구나), 萬里欲觀海(머나먼 바다가 보고팠는데), 七日當復陽(이레 날이 마침 동지로구나), 獨立故山碧(홀로 외롭게 서니 옛 산만 푸르고), 百計無一方(아무리 헤아려도 방책이 없네), 白白千丈水(희고 흰 저 천길 물속이), 足吾一身藏(내 한 몸 넉넉히 간직할 만 하여라)
그리고 이튿날이 바로 동짓날이니,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그는 최후의 순간을 해가 떠오르는 시각에 맞추었다. 바로 그곳 산수암 바위 위를 떠난 그는, 암초를 밟고 미끄러지며 차가운 바다 속으로, ‘내 조국! 떠오르는 해처럼 빛나라!’는 기도의 소원을 안고 들어갔다.
김도현선생은 살아서 이루지 못한 일본 패망의 염원과 태양처럼 빛날 조국을 위하는 염원을, 죽어 혼이 되어 도와보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졌다. 그의 겨레 사랑은 떠오르는 아침 태양과 같이 변함없었고, 그의 국권회복의 염원은 천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바위 같았다. 또한 변함없이 차가운 동해바다는 오늘날 우리 후대들이 배워야 할 그의 올바르고 곧은 신념이 아닌가! 정부에서는 1962년 선생을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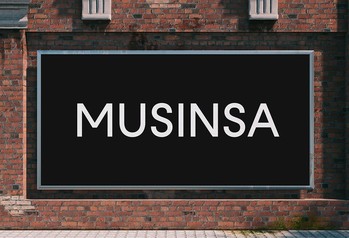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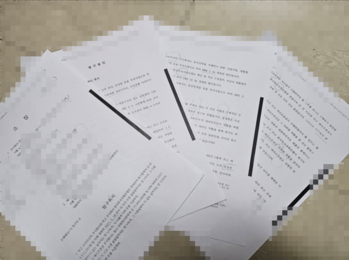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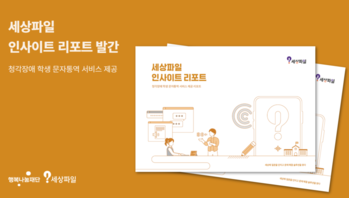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