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허준혁 UN피스코 사무총장 |
[일요주간=허준혁 칼럼니스트]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지식과 소통의 민주화를 위해 태어났다. 읽고 쓰기가 불가능했던 백성들에게 언어를 공공재로 나누어준 것이다. 하지만 남북의 언어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남북 어휘 차이를 35~40%로 추산했고, 북측 사회과학원은 전체 어휘 50만 단어 중 15%가 남측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과학·IT 분야의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남측에서는 매년 약 2천 개의 신조어가 탄생하지만, 북한은 약 200개에 그친다. 한국은행은 언어 통합 지연 시 통일 비용이 약 15%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사회·경제 통합의 비용과 직결되는 요소다.
남북 언어의 이질화 해소를 위해 2005년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이 시작됐으나, 2016년 이후 중단됐다. 현재까지 등재된 단어는 12만 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오늘날은 AI 시대다. 현재 한국어 AI 말뭉치는 1억 문장 규모로 구축돼 있다. 북한 자료가 추가된다면 데이터의 다양성과 활용 가치는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남북이 공동으로 AI 기반 언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자동 통번역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언어 격차는 실시간으로 해소될 수 있다. 동시에 한국어는 글로벌 AI 생태계 속에서 독자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은 이미 확산 중이다. 남북 합산 약 7천6백만 명이 한국어를 사용하며, 해외 동포는 708만 명에 달한다. 한국어 학습자는 180개국 180만 명을 넘었다.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수출은 2023년 137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 GDP 세계 13위, 무역 규모 세계 7위라는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는 한국어가 유엔 제7공용어로 채택될 충분한 조건을 보여준다.
현재 유엔 공용어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 등 6개다. AI 기반 실시간 번역과 음성합성 기술을 활용한다면, 유엔은 매년 약 3억 달러의 문서 번역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국어 채택은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과 혁신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세계한인 네트워크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전 세계 708만 재외동포는 각국에서 한국어 확산과 국제 여론 형성의 촉진자가 될 수 있다. 이들은 단순한 언어 사용자가 아니라, 한국어를 국제적 언어로 확산시키고, 남북 화해와 국제 협력의 글로벌 촉진자로 기능할 수 있다.
한글은 한국인의 정체성인 동시에 인류의 자산으로 확장될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문자다. 한글은 분단을 넘는 다리이자, 세계로 향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평화, 협력이라는 인류 공동의 과제를 풀어가는 문자이자 언어가 되어야 한다.
AI시대를 맞아 남북이 공동으로 겨레말 큰사전 편찬과 UN 제 7공용어 지정을 추진에 남북은 물론 전세계한인들이 뜻과 힘을 모아야할 때이다. 그렇게함으로써 분단의 언어는 화해의 언어로, 겨레의 언어는 인류의 언어로 승화시켜 나가야한다.
“말이 통하면 마음이 통한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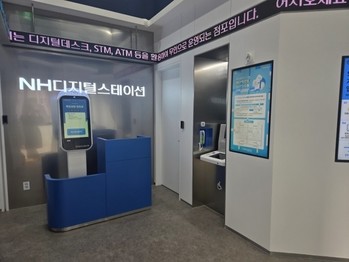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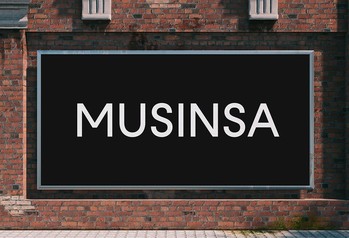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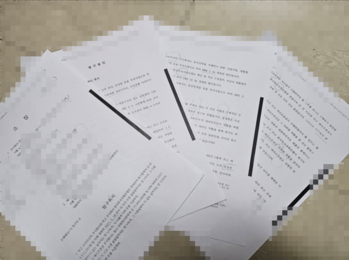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