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산이 문헌상 최초로 등장하는 시기는 삼국 시대 초기다. 삼국사기 본기 온조왕에 관한 기록이다.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 유리가 와서 태자가 되자,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용납되지 못할까 두려워 마침내 오간 · 마려 등 열 명의 신하와 더불어 남쪽으로 갔는데 백성들이 따르는 자가 많았다. 그들은 드디어 한산(漢山)에 이르러 부아악(負兒嶽)에 올라가 살만한 곳을 바라보았다.』
상기의 기록을 살피면 한산이란 지명과 부아악이 등장한다. 한산은 지금의 서울 지역을 지칭하는 말로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정복한 이후 한강 이북을 ‘북한산주’라 명하였고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이후 한강 이남, 당시 경기도 광주 지역을 ‘남한산주’로 표기했었다. 아울러 지금의 북한산은 ‘부아악’으로 등장한다. 부아악은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업고 있는 형상을 의미하는데 흡사 바위의 모습이 그와 같아 붙여진 이름이다.
다음은 고려 말 대학자인 목은 이색의 시 ‘삼각산을 바라보며’(望三角山) 중 일부를 살펴보자.
세 봉우리 태초부터 솟았는데
하늘 가리킨 선장 천하에 드므네
三峯削出太初時(삼봉삭출태초시)
仙掌指天天下稀(선장지천천하희)
仙掌(선장)은 천자의 몸 뒤를 가로막는 부채로 바람을 막고 해를 차단하는 용도에 쓰인다. 세 개의 봉우리가 어우러져 흡사 선장과도 같다는 의미인데, 고려 시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산의 명칭이 삼각산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즉 고려 시대에는 북한산이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의 세 개의 봉우리가 삼각형의 뿔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삼각산 혹은 삼봉으로 불리었다.
다음은 역시 고려 말 대학자인 도은 이숭인의 시 중 일부를 살펴보자.
삼봉 은자에게 부치다(寄三峯隱者)
화산 남쪽 바라보니 위태롭기만 한데
산속 그윽한 거처 낮에도 사립문 닫혔네
그 마음 어찌 세상을 피하려 함인가
본시 속인의 왕래가 드물 따름이네
華山南望一髮微(화산남망일발미)
山中幽居晝掩扉(산중유거주엄비)
渠心豈肯避世者(거심기긍피세자)
自是俗人來往稀(자시속인내왕희)
상기의 작품은 이숭인이 정도전에게 보낸 시다. 정도전, 이숭인, 김구용 등은 고려 말 우왕 당시 권신인 이인임과 경복흥 등의 친원배명 정책에 반대해 북원(北元, 명나라에 의해 북으로 쫓겨난 몽고 왕조)의 사신을 맞이하는 문제로 그들과 맞서다 귀양 간다.
후일 유배에서 풀려나자 정도전은 곧바로 개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삼각산에 초가집을 짓고 후학들에게 강연을 베풀며 자신의 호를 산 이름을 따서 삼봉이라 칭한다. 이 무렵에 도은이 보낸 시로, 후일 정도전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지 않는다 하여 심복 황거정을 보내 이숭인을 살해하지만, 상기의 시에서는 북한산이 화산으로 등장한다.
하여 상기의 기록들을 살피면 북한산의 명칭이 부아악으로 시작하여 삼각산, 삼봉, 화산으로 불리었음을 살필 수 있다. 이후 삼각산이란 명칭으로 조선조 말까지 지속되는데 느닷없이 북한산으로 바뀐다. 이 부분에는 아쉽게도 일본이 개입되어 있다.
일제강점기로 넘어오면서 일본인들이 토지정리를 하던 중에 삼각산이란 이름을 무시하고 지명인 '북 한산'을 산 이름 ‘북한산’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이 지명을 착각하여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단순한 착각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
일제 치하 당시 여러 지명들이 상·하, 혹은 남·북 등으로 갈리고는 했다. 비근하게 예를 들자면 경기도 가평의 조종면이 상면과 하면으로 분리된 일을 들 수 있다. 물론 우리민족의 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의도적 결과였다.
그런데 더 우스꽝스러운 일은 우리의 태도였다. 지난 1983년 국립공원 지정 당시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명명하면서 산 이름이 '북한산'으로 완벽하게 굳어졌으니 산 이름의 변천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침을 튀기며 분개하는 일을 이해할 만도하다. 아울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가 북한산의 이름을 허용해야 하는가의 문제 또한 제기된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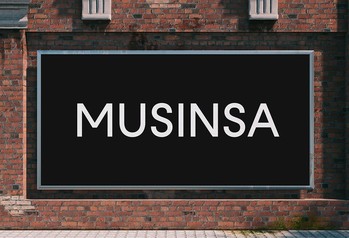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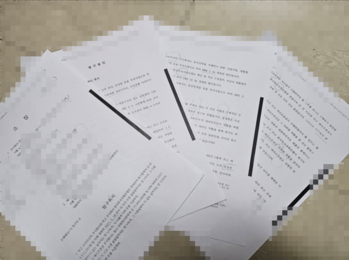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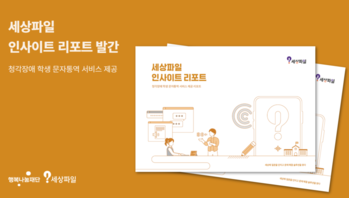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