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연결
‘일대일로’ 구상에 아랍정책 명확히 제시
본보는 특별기획 일환으로 ‘차이나 벨트’ 코너를 신설해 중화권 전반의 모든 것을 심층 조망한다. 한중 관계 경제교류는 한층 위력을 발하고 있다. 양국간 교역은 상호 최상위권에 있으며,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을 통해 글로벌 경제 주축의 핵심 역할론 연착륙에 자신감을 고양시키고 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은 세계 주요통화로서 위상을 확장 심화시킬 것이다. 이에 본보가 홍콩에서 중화권 무역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Kstars 그룹 리키장’과 함께 중화권 ‘경제·금융·무역’ 흐름을 심층 리뷰하며 전망 예시하는 기획 스페셜에 독자 제현의 호응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원대한 비전 ‘유럽 아시아’는 하나
중국은 미국과 유럽 위주의 세계경제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기 위해 2015년 3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건설 추진의 비전과 행동’이라는, 일명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정책을 발표한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9~10월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처음 제시한 전략이 일목요연하게 구현된 것이다. 중국이 국제통화기금(IMF) SDR(특별인출권)의 기축통화 편집 결정은 시진핑 주석이 줄기차게 추진해온 육해상 실크로드의 완결편인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에 힘찬 날개를 단 셈이 되었다.
일대일로는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중화 경제권이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Eurasia) 대륙을 아우르는 위안화 경제권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동남아-서남아-중동-아프리카까지 연결되는 ‘실크로드 경제블록’이 구축되면 이곳에선 위안화가 제1통화가 될 것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중앙아시아의 천연자원과 에너지를 확보하고 중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를 꿈꾸기 위한 그랜드 거시적 정책인 일대일로의 하나의 중심축인 ‘일대’(One Belt)는 ‘신(新)실크로드 경제벨트’로 중국 서북 지역에서 중앙아시아, 유라시아 대륙과 유럽을 관통하는 육상 무역통로를 말한다. 또 하나의 중심축 ‘일로’(One Road)는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해상 협력을 기초로 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로 중국 동남 연해지역에서 동남아시아, 인도양, 중동을 연결하는 해상 경제 무역통로다.

육상 실크로드는 신장(新疆)자치구에서 시작해 칭하이성(靑海省)-산시성(山西省)-네이멍구(內蒙古)-동북지방 지린성(吉林省)-헤이룽장성(黑龍江省)까지 이어지며, 명나라 때 쩡허(鄭和·1371~1433)의 남해 원정대가 개척한 해상 실크로드는 광저우(廣州)-선전(深圳)-상하이-칭다오(靑島)-다롄(大連) 등 동남부 연안도시를 잇는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를 연결하는 핵심적 거점으로는 신장자치구가 개발되며 동남아로 나가기 위한 창구로는 윈난성(雲南省)이, 극동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동북 3성이, 내륙 개발을 위해서는 시안(西安)이 각각 거점으로 활용된다. 중국과 아시아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의 거점으로는 푸젠성(福建省)이 개발된다.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중국은 동남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경제권의 활성화, 유럽 경제권의 활성화, 그리고 더 나아가 21세기 중국의 경제발전과 성장을 꾀하고자 하는 야심을 굳이 숨기지 않고 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일대일로’ 구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핵심키’로서 중국은 일대일로 권역 국가들에 AIIB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대출해줌으로써 거대한 경제권을 구축하려는 팩스 차이나를 공공연히 꿈꾸고 있다.
일대일로가 구축되면 중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로 묶는 유라시아(Eurasia) 대륙에서부터 아프리카 해양에 이르기까지 육·해상 실크로드 주변의 60여 개국을 포함한 거대 경제권이 구성된다.
세부적 이행 각론은 고속철도망을 통해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고 대규모 물류 허브 건설, 에너지 기반시설 연결, 참여국 간의 투자 보증 및 통화스와프 확대 등의 금융 일체화를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를 건설한다.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인 외환보유액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서 2049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인프라 건설 규모는 1조 400억 위안(약 185조 원)으로 추정된다.
철도, 도로, 해운 등에 과감한 인프라 투자를 통한 일대일로 성공적 구축은 중국이 안정적 자원 운송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중국의 과잉 생산을 해소하는 방안이 되고, 건설 수요 급증으로 중국 서부 내륙과 동부 연안 사이에 지역 간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덧붙여 소수민족의 통합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서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인프라 구축의 최전선에서 일대일로는 육상과 해양뿐만 아니라 이제는 항공까지 아우르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기존 항공시장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廣州)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국제선 시장보다는 자국 내 국내선 시장을 중점 육성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대일로’를 배경으로 인프라 투자와 건설이 활발해지면서 중국 중서부 지역 시장이 발달하고 있으며, 국제선 역시 빠르게 확충되며 새로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단적인 실례로는 중국 서부지역의 공항 건설을 통해 노선을 확대하고 중앙아시아를 관통하여 중국과 유럽이 연결되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중동, 유럽 등의 일대일로 국가와 국제선 직항노선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중국의 종합국력이 강화되면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요구들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등장한 ‘중국 역할론과 중국책임론’은 새로운 정부 지도층이 피할 수 없는 전략적 난제가 되었다. 이제 세계 최강국의 반열에 선 중국은 전 세계 각 대륙별로 맞춤형 약진전략을 적재적소 구사하는데 일절 주저하지 않고 있다. 주요 거점별 외교적 영향력 제고 방안을 중점 분석해 본다.
실크로드 복원의 구심점 ‘아랍’
2010년 말 ‘아랍의 봄’사건 이후 아랍권역 국가들은 정치혼란, 경제난, 내전에 따른 국가붕괴 등의 큰 타격을 입었다. 석유달러로 힘겹게 고비는 넘겼으나 산업 다원화 과정의 개혁압력에 직면해 있어 중국의 기술, 자본, 제품 이전에 폭넓은 가능성이 생겨났다.
중국에게는 중국-아랍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있어 경제구조전환 및 에너지안보구축과 관련해 아랍국가가 매우 중요하다.
아랍세계 역시 동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의 ‘서역(西域) 진출’ 바람과 맞아 떨어져 중동 지역의 ‘동쪽구경’이 ‘일대일로’의 틀 안에서 조화롭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에 아랍국가 정책을 명확히 제시했다. 2016년 1월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중국의 대아랍국가 정책문건’(中国对阿拉伯国家政策文件)은 중국이 아랍정책을 분명하고 완전하게 기술한 첫 번째 문건이자 아랍외교구상에 대한 강령이다. “중국대륙과 아랍세계는 2000년 동안 육로 및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하나로 이어져 왔다”는 문구를 서두에서부터 명시한 바 중국과 중동, 특히 아랍세계는 역사 깊은 우호관계를 맺어 왔다는 것이 총 7600자로 이뤄진 문건의 주 요체이다.

또한 문건은 “중국과 아랍이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전방위적·다층적으로 더 넓은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시켜나가야 한다.”며 “중국이 아랍과의 관계를 전략적 측면에서 고도로 중시해왔으며, 중국-아랍간 전통적 우호를 다지고 심화시키는 게 중국 장기 외교방침”이라고 재차 강조한다.
중국은 이미 2004년 1월 31일 이집트 국빈 방문에서 후진타오(胡錦濤) 前 중국 국가주석은 ‘아므르 무사’(Amr Moussa) 아랍연맹 사무총장과 공동성명을 통해 ‘중-아랍연맹 협력포럼’을 발족시키면서 이 지역에 남다른 공을 들어왔다.
중국의 중동 핵심 전략은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이다.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중동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 됐다고 자원 컨설팅 업체 ‘우드 매켄지’(Wood Mackenzie)를 인용해 조선일보가 2013년 10월 15일 보도한 바 있다.
2013년 상반기 중국이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유는 하루 370만배럴로 미국(350만배럴)을 앞질렀다는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OPEC 원유 최대 수입국이 될 것이라고 우드 매켄지는 전망했었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로부터 원유 수입을 계속 늘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15년 1∼11월 중국이 수입한 원유 중 4분의 1이 사우디와 이란에서 도입한 것이다.
2016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중동의 사우디, 이집트, 이란 3개국을 방문했다. 국제유가가 바닥을 헤매면서 재정난 위험이 제기되는 이들 산유국에 대한 중국의 접근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했다는 평가이다. 중국과 사우디는 각각 세계 최대의 석유수입국, 수출국이다.
시 주석은 1월 19일 ‘살만 빈 압둘아지즈’(Salman bin Abdulaziz)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만나 양국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 14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우디는 중국과 일대일로 계획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한바, MOU에는 중국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에 이르기까지 도로, 철로, 항구, 공항 등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계획과 고에너지형 원자로를 짓는 계획 등이 두루 포함됐다.
또한 양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를 ‘윈윈' 금융 플랫폼으로 공유에 따른 경제적 유대를 공고히 했다. 이어 두 정상은 사우디와 중국 국영 석유회사가 공동 투자한 걸프만 정유공장 개소식에 참석해 경제외교에 방점을 찍었다.
전쟁의 포화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이라크 또한 석유자원 선점에 따른 중국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2015년 12월 23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하이데르 알아바디’(Haider al-Abadi) 이라크 총리와 협상에서 중국은 장기적이고 공고한 에너지 협력 파트너 차원에서 석유 추출과 정제공장 건설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태평양에서 서아시아와 중동을 지나 대서양을 잇는 실크로드 경제 구역 구상에 이라크를 전격 합류시킨 것이다.
옛 공산국가 유대복원 ‘동유럽’
2016년 3월 2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밀로시 제만’(Milos Zeman) 체코 대통령은 프라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일대일로(一帶一路)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체코의 발전 전략의 접목 강화는 물론 중국과 동유럽 국가 간의 ‘일대일로’ 협력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시 주석과 제만 대통령은 전자상거래, 투자, 과학기술, 관광, 문화, 항공 등 분야의 협력문건에 서명했다. 1949년 양국 수교 이후 중국 정상이 체코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시 주석이 취임 후 동유럽 국가를 찾은 것 역시 처음이다.
중국이 유럽의 옛 공산국가들 유대관계 복원은 동유럽 16개국과 중국 간의 ‘16+1 협력’ 채널 구축이다. 중국은 공산정권 시절의 외교관계를 복원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동유럽을 '일대일로'로 포용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중국 ·동유럽 회의(CEE)를 창설하고 동유럽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동유럽 정상들은 2015년 11월 24일 중국 장쑤(江蘇)성 쑤저우(蘇州)에서 열린 제4차 중국·동유럽(CEE)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정상회의에서 “이 지역 내 다양한 프로젝트에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국제 금융기관을 공동 창설하자”고 제안했다.
또 리커창 총리는 동유럽은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의 투자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이 곧 착공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리커창 총리는 동유럽국가와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발트해, 아드리아해(Adriatic Sea), 흑해 연안지역의 인프라 설비 건설과 개선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관영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동유럽 16개국 정상과 만나 자신의 글로벌 경제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적극 홍보했다. 시진핑 주석은 ‘16+1협력’이 탄생한 이래 전방위적 다차원적인 협력구도를 형성했으며, 중국과 전통친선나라간 관계발전의 새로운 경로가 개척되었으며, 중국과 유럽관계의 실천을 혁신하는 남남협력(南南協力)의 새플랫폼을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CEE 정상회의는 중국과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폴란드,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 16개 국가 지도자들로 구성된다. 2015년에는 EU와 오스트리아, 그리스, 유럽개발은행의 대표가 옵서버로 참석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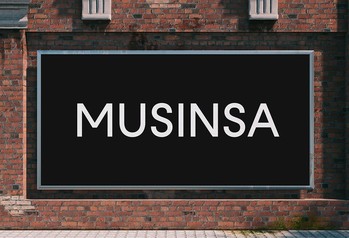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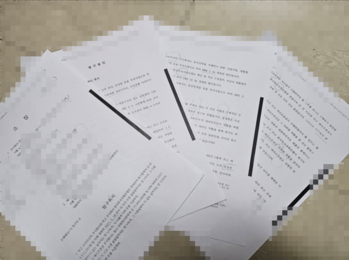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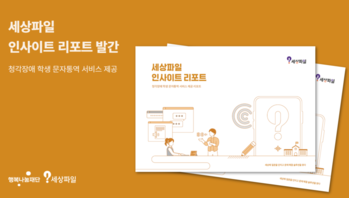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