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소정현 기자] 본보는 특별기획 일환으로 ‘차이나 벨트’ 코너를 신설하여 중화권 전반의 모든 것을 심층 조망한다. 한중 관계 경제교류는 한층 위력을 발하고 있다. 양국간 교역은 상호 최상위권에 있으며,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을 통해 글로벌 경제 주축의 핵심 역할론 연착륙에 자신감을 고양시키고 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은 세계 주요통화로서 위상을 확장 심화시킬 것이다. 이에 본보가 홍콩에서 중화권 무역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Kstars 그룹 리키장’과 함께 중화권 ‘경제·금융·무역’ 흐름을 심층 리뷰하며 전망 예시하는 기획 스페셜에 독자 제현의 호응과 관심을 부탁드린다.(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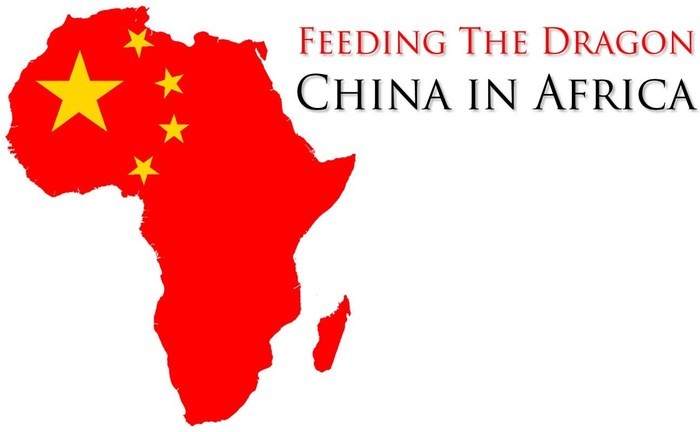 | ||
| ▲ 2000년대 들어 중국과 아프리카 경협은 미국 등 서방의 견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아프리카 대륙에서 중국이 고도성장에 필요한 핵심 자원을 확보하려는 구도하에 본격 추진됐다. | ||
중국 왕이(王毅) 외교 부장은 2016년 1월 30일부터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등 아프리카 4개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 중국과 아프리카 경협은 미국 등 서방의 견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아프리카 대륙에서 중국이 고도성장에 필요한 핵심 자원을 확보하려는 구도하에 본격 추진되었다. 급속히 수요가 늘고 있는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아프리카라는 거대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야심에서이다.
현재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의 제1의 무역 파트너이고, 아프리카는 중국의 4위의 해외 투자 거점지가 되었다. 2011년 중국·아프리카 무역액은 1663억달러에 달해, 2000년 대비 16배 늘었다. 2011년 중국에 대한 아프리카 무역 흑자는 201억달러에 이르렀다.
이미 중국은 2009년부터 미국을 추월해 아프리카의 최대 무역 대상국이 됐다. 2013년 기준으로 중국의 아프리카 교역액은 미국의 두 배 정도로 아프리카 총 무역의 15% 정도를 차지한다.
상품 교역에서 중국과 아프리카의 무역액은 2000년 106억달러에서 2014년 2216억달러로 연평균 24.3%, 21배 급가했다. 중국의 아프리카 수출은 50억달러에서 1060억달러로, 수입은 56억 달러에서 1156억 달러로 각각 24.3%, 24.2%씩 증가했다.
중국은 현재 중동에서 연간 290만 배럴을 수입해 원유 수입의 52%를 의존하고 있으며, 둘째로 아프리카에서 130만 배럴, 23%를 수입하고 있다. 향후 에너지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증가하는 만큼 중국의 안정적 자원 확보 전략은 지속될 전망이다.
신천지이자 부활의 대륙
아프리카는 지구촌의 마지막 자원 보고이자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의 광물 자원은 자본과 기술 부족에 효율적으로 발굴되지 않아 개발 잠재력이 무척 높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은 경제성장률이 평균 4.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후 거대한 소비 시장이 될 것은 상당히 낙관적이다. 이는 아시아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이 때문에 각국은 아프리카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에 가장 적극 투자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석유 등 자원 개발사업과 인프라 구축은 물론 무역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 진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대륙 공략의 핵심 채널은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CAC)이다. 1999년 중국 정부는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장관급 회의를 개최를 제의하면서 중국과 아프리카 우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의 도전에 공동 대응하며,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쌍방의 공동 노력 하에 첫 장관급 회의가 2000년 10월 베이징에서 개최되면서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CAC)이 공식 설립되었다.
중국과 아프리카 쌍방이 21세기 장기적인 안정과 평등 호혜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건립 발전시키는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시스템 구축이 첫 삽을 뜬 역사적 이정표였다.
3년마다 정상급 회의를 개최한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은 중국·아프리카 쌍방의 집단 대화와 실질적 협력의 효과적인 플랫폼으로 조기 정착했다. 쌍방의 협력은 더 큰 범위, 더 넓은 영역과 더 높은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2006년 개최된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베이징 정상 회의 및 제3회 장관급 회의에서 중국·아프리카는 정치적으로 평등 상호 신뢰하고, 경제적으로 협력 상생하며, 문화적으로 상호 교류하고 배우는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중국·아프리카 관계의 역사에서 기념비적 의미를 갖고 있다.
 | ||
| ▲ 중국은 중남미에 석유와 광물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이를 차질없이 운송할 관련 인프라 건설에 총력 태세. | ||
석유자원 확보에 전방위 지원
중국이 자체 내수시장 포화에 따른 새로운 개척시장으로서 아프리카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며, 중동에 이어 석유자원 확보인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중국은 섬유, 에너지 등 산업지원을 위한 원조와 차관 제공 및 이들의 규모 확대, 채무 면제, 개발펀드 설치, 빈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공과 인력교육, 의료지원까지 다양하고 포괄적인 아프리카 지원정책을 일관되게 펼쳐 왔다.
최근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자원 사업에 수반되는 금융·교통운수·제조 등의 진출과 함께 서비스 부문의 투자도 증가 추세이다. 특히 중국은 아프리카의 도로·철도를 짓는 SOC 투자에 적극적이다. 아프리카가 공업화와 도시화, 경제부흥의 과정을 거치면서 건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2012년까지 누계로 217억3000만 달러에 이르는 아프리카 해외 직접투자(FDI)는 초기에 광산과 에너지 등 자원 분야에 집중되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2014년 아프리카 나라들을 순방하면서 고속철도사업 판매에 나서는 세일즈 외교를 전개했고, 동부 아프리카 6개국을 연결하는 초대형 철도사업을 수주했다.
중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는 남아공·앙골라·나이지리아·이집트·알제리 등으로 이들 5대 무역 대상국이 전체 교역의 61%, 10대 국가가 73%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된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국가는 이집트와 남아공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과 북쪽에 끝에 자리 잡은 양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영향력이 강력하다. 특히 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국 남아공은 풍부한 자원과 경제발전 잠재력을 가진데다 국제무대에서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정치적 발언권으로 중국은 남아공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아공은 아프리카 53개국 전체 GDP의 27%를 차지하며, 아프리카 30대 기업 가운데 26개가 남아공에 포진하고 있다.
남아공의 최대 강점은 자원 대국이라는 것이다. 남아공 전체 수출의 30%가 천연자원이다. 백금, 망간, 금, 크롬, 질석, 바나듐, 다이아몬드 등 7가지 광물의 매장량과 생산량이 모두 세계 1위다. 원자력 발전에 필수적인 우라늄 매장량 4위, 철 생산량은 7위다.
앙골라는 나이지리아와 더불어 아프리카의 2대 산유국으로 일일 원유생산량이 210만 배럴에 달한다. 앙골라는 중국이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많은 원유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다. 중국은 원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앙골라에서 주택, 공항, 철도, 도로, 병원 등을 건설해왔다.
엘로라도 기회의 땅 ‘중남미’
거대 인구와 경제성장, 소득상승에 따른 폭발적 에너지 수요에 중국은 자원외교에 혈안을 올리고 있다. 이제 중국에게 있어 중남미는 미국의 텃밭이 아니라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듯, 새로운 값진 보물이자 진주이다.
이제 중국은 '기회의 땅'인 라틴 아메리카(Latin America) 진출에 박차를 가하면서 엄청난 재정적 화력을 퍼붓고 있다. 이에 자원이 풍부한 중남미에 투자 및 무역 규모 확대는 괄목할 신장세의 연속이다.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는 2014년 기준으로 중국의 전체 해외투자의 약 8.5%를 차지하며, 주요 투자 분야는 에너지 및 자원 분야이다.
그리고 중국과 중남미 새로운 밀월 관계는 이전의 자원외교 뿐만 아니라 인도적 목적, 무기 판매 및 기술 이전 등으로 확대 추세이다. 중국이 눈독들이고 있는 것은 중동과 아프리카에 이어 석유자원이다.
중국은 1993년 원유 순수 수입국으로 전락한 이후 국제 원유시장의 의존도가 60%에 육박했으며, 2035년에는 8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연가스 수입의존도 또한 32%에 달한다.
또한 중국은 2013년 연말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수입국이 됐으며, 2015년 4월 중국의 석유 수입량은 일간 740만 배럴에 달해 미국의 일간 수입량인 720만 배럴을 초과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은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및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으며, 기존의 공급원을 확대하면서 수입원의 다변화는 물론 수송로의 안전 확보에도 혈안이다.
중국의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2015년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브라질, 페루, 칠레, 콜롬비아 등 남미 4개국 순방을 방문하여 수십 개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남미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6년 중-라틴아메리카 간의 무역규모는 720억 달러였으나, 중국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중국-라틴아메리카 무역액은 2636억달러에 달했다. 중국 입장에서도 라틴아메리카는 7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이미 브라질, 칠레와 페루 등 이들 라틴아메리카 나라 최대의 무역 파트너이다.
중국은 아프리카 및 아랍과 이미 협력 포럼을 가동하고 있다. 이어 중국과 중남미 국가들이 참여하는 ‘중국-라틴아메리카(CELAC) 포럼’이 2015년 1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첫 장관급 회의를 갖고 공식 가동되었다. ‘중국-라틴아메리카 포럼’은 2014년 7월 브라질을 방문한 시 주석의 제의에 따라 탄생했다. 지난 2011년 멕시코에서 출범한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는 美洲 대륙에서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33개국으로 이루어진 국제기구다.
‘양양철도(兩洋?路), 니카라과 운하’
석탄과 철광석 원자재와 대두 등 식량을 브라질,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입하는 중국으로서는 이들 전략물자들의 안정적 운송로 확보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여기에서 큰 주목을 끄는 것은 중국 자본과 기술 주도의 철도건설과 파나마 운하에 이은 제2의 운하건설이다.
중국이 착수한 양양철도(兩洋?路)는 브라질의 대서양 연안과 페루의 태평양 연안의 두 대양을 연결하며 안데스산맥을 관통하는 횡단 철도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장악한 파나마 운하를 거치지 않고 대두·철광·석탄 등 남미 자원을 수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려고 한다. 중국 자본 회사가 '제2의 파나마 운하(태평양~대서양 연결)'로 불리는 ‘니카라과 운하’를 착공한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중국의 신(新) 실크로드 전략이 미국 뒷마당인 남미까지 확장하는 모양새다.
양양철도 청사진은 2014년 7월 1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라틴아메리카 방문 당시 브라질과 페루 지도자들과 함께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Brasilia)에서 발표된 ‘중국-브라질-페루에서 양양철도 협력을 추진할 데 관한 성명’에서 제기됐다.
라틴아메리카 사상 첫 번째 남미대륙을 횡단하는 국제적 철도노선이 될 양양철도 완공에는 5년간 100억달러(약 11조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중국의 관영 환쵸우스빠오(環球時報)는 전한다. 브라질과 페루를 잇는 횡단철도 총 연장 5000㎞ 중 2000㎞는 기존 노선을 이용하고 새로 건설되는 구간은 3000㎞에 이른다.
특히 양양철도는 아르헨티나 또한 수혜 대상이 됨은 물론 브라질의 경우 물류비용의 30%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양철도가 건설되면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남미 대륙 동반부의 화물을 열차로 페루로 보낸 뒤 배에 실어 태평양 건너 중국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세계의 주목을 끄는 초대형 뉴스는 중국 주도의 제2의 파나마 운하(Panama Canal) 건설이다.
니카라과 정부와 홍콩의 니카라과 운하개발(이하 HKND)은 2014년 7월 7일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400억 달러(42조 원)가 투입되는 ‘니카라과 운하’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니카라과 운하 완공 소요예정 기간은 5년이다.
총 길이가 파나마 운하의 3배인 278㎞에 달하는 니카라과 운하(Nicaragua Canal)는 태평양의 브리토(Brito)강 입구에서 시작해 리바스 시(Rivas city)를 거쳐 니카라과 호수를 통과한 뒤, 카리브해 남쪽까지 툴레 푼타 고르다 하천(Tule and Punta Gordas rivers)을 지나는 루트를 확정했다.
특히 니카라과 운하는 중국 기업이 건설권과 운영권을 확보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신웨이(信威)공사를 경영하는 사업가 왕징(王靖)이 2013년 6월 따냈다. 왕징이 소유한 개발회사 '홍콩니카라과운하개발'(HKND)은 운하 건설권과 50년간 운영권을 확보했다. 니카라과 운하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중국은 니카라과 운하를 통해 남미 지역에서 수입하는 에너지 수송로가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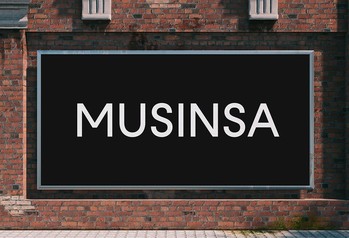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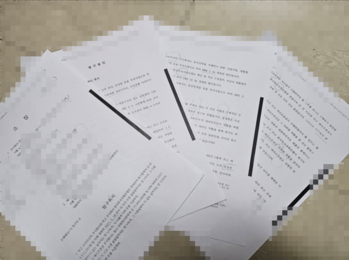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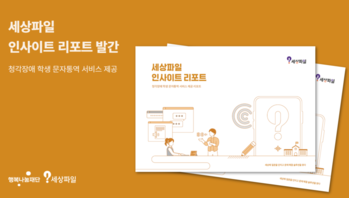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