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최형선 칼럼니스트 | ||
그러나 회사를 옮기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 옮긴 회사에서 처음 마케팅과 프리세일즈 일을 담당하던 중 영문 매뉴얼을 잠시 적게 되었는데 좋은 피드백을 받게 되면서 테크니컬라이팅이 나의 일이 되어버렸다.
당시 회사는 해외에서 반도체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난 프리세일즈, 제안서 작성, Requirement Survey(요구사항 수집) 단계부터 설계, 테스트, 기술 이전 및 교육, 프로젝트 종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출물 작업에 투입되었다. 필요하다면 법률문구 작업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난 ‘No’란 말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개발자들이 바빠서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내가 하겠다고 자청했고 제품 설명을 위해 출장을 가야 한다면 해당 지역에 가서 원하는 자료를 만들어 발표하곤 했다. 그때는 성취감 때문에 그 상황들을 즐겼던 것 같다. 젊을 때 해외 여러나라를 돌면서 경험을 쌓는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에서 피곤해도 참고 일을 했다.
나의 본업은 요구사양서, 기능사양서, 매뉴얼, 시스템 설치가이드, DB 스키마, 시스템 관리가이드 등을 만드는 일이었다. 또 마케팅을 위해서 기술 카탈로그, 유스케이스(Use Cases)나 교육 키트 제작 작업을 하거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 일도 진행했다. 나중에는 CMMI 인증을 위해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일도 했고 미국 본사에서 진행하는 제품 문서 제작에도 참여했다.
당시 난 우리나라에 나와 같은 일을 하는 테크니컬라이터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내가 한국의 1세대 테크니컬라이터라는 것이었다. 멘토들을 만나기 전까지 난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문서작업을 했었다. 아무도 내가 쓴 문서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 당시 난 영어를 세련되고 화려하게 적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표현을 탐구하는 프로그램을 매일 진행하고 있었다. 더불어 매일 에세이를 적으면서 나의 생각을 정리했다.
영어권 엔지니어들이 영어를 잘 적었다는 평을 해줄 때면 그것에 마냥 즐거워 했다. 하지만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멘토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었다.
본사 문서작업에 참여하면서 많은 멘토를 만날 수 있었다. 메리 레인(Mary Lane), 스티브 마티니(Steve Marteny), 데이브 퍼니하우(Dave Ferneyhough) 등이 내 글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었고 난 빨갛게 색칠된 문서를 재수정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처음에는 수정할 것이 너무 많았었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나자 멘토들이 피드백을 주지 않았다. 더이상 멘토링이 필요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다가 문서조직의 직속 매니저인 존 와이트(John Wight)를 만났다. 그는 뚱뚱하면서 왠지 둔해 보이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게 충격적인 두 시간의 강의를 전달해 주었다. 난 이전까지 글쓰기에 대한 이론 교육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의 강의를 다른 이들과 함께 들었지만 나만 감동하고 있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맨땅에 헤딩하면서 문서를 개발해왔었는데 그 모든 경험이 그 강의를 통해 정리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쓸모 없는 경험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그 짜릿함을 즐기고 있었는지 동료들은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난 그의 가르침의 가치를 알았기에 당장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고 그의 사무실에서 긴밀히 토론하며 내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그때부터 내가 생각하는 문서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다. 그가 소개해준 책을 자세히 읽었고 내 속에 해당 철학을 모두 흡수할 수 있었다.
테크니컬라이팅 강의를 할 때면 난 스킬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 철학을 강의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곤 한다. 왜냐하면 스킬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지만 철학은 속에서 숨쉬며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의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난 오늘 나의 이야기를 주로 했다. 어떤 이는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내 얘기를 했을 거라 여길 것이다. 천만에! 난 내가 성공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전기를 쓸 생각도 없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던져주는 의미와 철학을 발견하기 원한다.
첫째, 칼럼을 쓰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면 독자와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분야에 종사하면서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문화나 기술은 혼자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싶었다. 내게 많은 멘토들이 있었기에 배움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그들의 철학을 기반으로 새로운 철학을 소화하고 또 창조해낼 수 있었다. 그들에게 감사한다.
셋째, 문화나 기술은 흥미와 감성에 기반을 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난 즐거워 할 수 있었기에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글쓰기의 묘미를 발견하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었다.
글쓰기에 대한 열정은 호기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내 삶을 완성시키고 싶어했던 나의 갈구였다. 즉, 내게는 남다른 감성이 있었던 것이다. 난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 감성이 뛰어난 사람이 결국 경지에 다다른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이 가을의 정취를 느끼지 못하는 자가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한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넷째, 여유를 가져야 한다. 문화나 기술은 전진만을 외치는 이들이 쉽게 구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내가 에세이를 쓰면서 글쓰기에 대한 나름의 철학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식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한다면 어떤 이론도 만들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한국인들은 서두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치곤 한다. 문서에 여백이 중요하듯이 또 발표하는 자가 속사포처럼 말하지 않고 쉬어가며 얘기해야 상대의 호감을 얻는 것처럼 여유를 아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기대기 마련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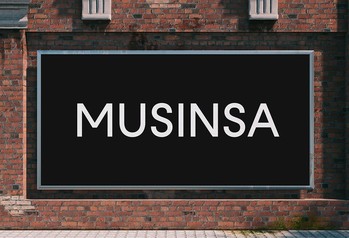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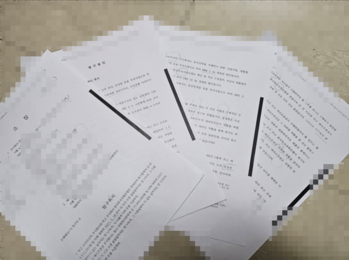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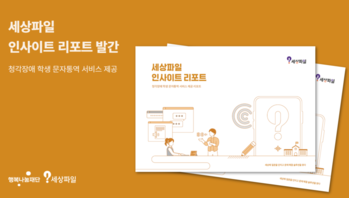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