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동의보감을 보면 황촉규는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산모가 출산 시에 난산으로 고생하는 경우 황촉규 씨를 가루로 내어 술에 개어 마시게 되면 순산을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 ||
[일요주간 = 송봉근 교수] 서가에서 오래된 고서를 꺼내 읽어본다. 묵은 책에서 나는 곰팡내와 은은한 한지의 냄새가 후각을 자극한다. 군데군데 얼룩이 지긴 했지만 어느 한군데 좀이 먹지도 않았고 쓰인 글씨도 전혀 색이 바래지지 않았다.
요즘 보는 오래된 책이 종이가 바스러지면서 낡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족히 150년은 훨씬 넘은 책이 이처럼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새삼 한지의 우수성을 실감하게 된다. 하긴 불국사 석가탑의 해체 과정에서 나온 최고의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다라니경도 천 년 동안 그대로 글자를 간직할 정도로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다 한지에 인쇄된 덕분이리라. 한지가 아니었다면 국보로 지정될 수도 우리의 우수한 인쇄술을 세계에 자랑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사실 장년층에 살아 온 사람들이라면 거의 한지와 함께 생활해 왔던 기억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한지에 기름을 바른 장판 위에서 잠을 잤고, 한지로 바른 창호지로 비치는 햇살을 보면서 잠을 깼고, 가끔은 한지 위에 붓글씨를 쓰기도 했다. 한지 바른 합죽선의 시원한 바람도 한지의 향기와 함께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한지는 어느 새 현대의 편리한 문명에 밀려 우리 주위에서 많이 사라졌다. 그런 중에도 한지축제를 여는 도시가 있고. 한지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도시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우리의 전통 문화의 하나로 보존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한지 산업이 쇠퇴하게 된 원인으로는 복잡하고 힘든 작업과정이라고 말한다. 사실 한지를 만드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우선 원료가 되는 닥나무를 채취해서 삶는 과정이 먼저다.
 |
||
| ▲ 전체에 털이 있고 줄기는 곧게 자란다. 여름이 되면 노란색의 꽃을 피운다. | ||
다음으로 삶은 닥나무는 햇볕에 말리고 다시 물에 불려 껍질을 벗기는 과정이 뒤따르게 된다. 껍질을 벗기고 나면 하얀 속껍질이 남게 된다. 이를 맑은 물에 하루 정도 불린 다음 잿물과 섞어서 푹 삶는다.
삶은 하얀 껍질은 다시 물에 담가 잿물을 제거하고 햇볕을 받도록 한다. 이런 과정으로 더욱 하얗게 변한 껍질을 돌 위에 올려놓고 두들겨서 섬유가 풀어지도록 한다.
이렇게 풀려진 섬유질에 닥풀을 넣고 섞어서 섬유가 잘 풀어지도록 한다. 닥풀은 섬유질이 잘 뭉쳐지도록 할 뿐 아니라 중성화하는 작용을 한다.
바로 한지가 오래도록 변하지 않고 본래 모습을 간직하는 이유가 된단다. 잘 풀어진 섬유질과 닥풀을 물에 넣고 뜰채로 떠서 말리게 되면 바로 이것이 한지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닥풀은 황촉규(黃蜀葵)의 뿌리로 만든다. 황촉규의 뿌리는 점액질이 많아서 풀과 같은 성질을 띠기 때문에 닥나무의 긴 섬유질은 서로 엉기지 않도록 하면서 잘게 부서진 섬유질이 치밀하게 잘 엉겨 붙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
 |
||
| ▲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한지를 만드는 용도로 활용되고, 일본에서도 화선지를 만드는데 이용된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중요한 채소로 활용된다. | ||
황촉규(abelmoschus manihot)는 이전에는 무궁화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지만 최근에는 아욱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일년생 초본이다. 일명 닥풀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동의보감에서는 일일초라고 부른다.
황촉규는 원래 중국이 원산지라고 하며 우리나라와 일본 등지의 지역에서 주로 밭에서 재배하거나 자생한다. 전체에 털이 있고 줄기는 곧게 자란다. 여름이 되면 노란색의 꽃을 피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한지를 만드는 용도로 활용되고, 일본에서도 화선지를 만드는데 이용된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중요한 채소로 활용된다.
인도네시아나 남태평양의 섬나라 파푸아 뉴기니아 또는 피지에서는 잎을 날 것이나 아니면 삶거나 볶거나 해서 음식으로 먹는다.
음식을 바나나 잎으로 싼 다음 돌과 함께 굽는 음식문화가 발달한 남태평양의 지역에서는 황촉규 잎을 고기나 생선을 돌로 구울 때 바나나잎 대신 황촉규 잎을 사용하기도 하고, 황촉규 잎을 코코넛 크림이나 생선 등과 함께 구워 음식으로 먹기도 한다.
특히 이 지역에서 어린 황촉규 잎은 섬유질이 적고 비타민은 풍부하기 때문에 젖먹이 어린아이에게는 매우 좋은 이유식으로 활용된다.
 |
||
| ▲ 사실 천 년이 넘은 시간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 한지를 보면 한지의 제작과정에 필수적인 황촉규에 어떠한 의학적 효능이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 ||
황촉규는 의학적 용도로도 여러 지역에서 활용되어 왔다. 동의보감을 보면 황촉규는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산모가 출산 시에 난산으로 고생하는 경우 황촉규 씨를 가루로 내어 술에 개어 마시게 되면 순산을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황촉규는 각종 피부 질환에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는 약재이다. 우선 통증이 심하고 잘 낫지 않거나 고름이 계속되는 종기의 치료에 황촉규 뿌리를 짓이겨 환부에 바르면 매우 효과가 좋다고 의서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황촉규 잎이나 꽃을 소금과 함께 갈아서 환부에 붙여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화상을 입은 경우에도 황촉규 꽃을 말린 다음 가루로 만들어 기름에 개어 화상 부위에 바르게 되면 치료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의학에서는 황촉규가 맛은 달고 성질은 찬 약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열이나 염증을 완화하여 독을 없애고 대장을 윤활하게 하여 대변을 잘 통하게 하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에 효과가 있으며, 요로결석이나 산모의 젖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의 치료에 활용한다.
또한 외용약으로 각종 종기나 부스럼 및 골절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 데도 요긴하게 이용한다.
민간요법에서도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배뇨시 통증에 황촉규 뿌리를 물에 달여 마시고, 젖이 잘 나오지 않는 산모는 황촉규 뿌리를 삶은 콩과 돼지 다리를 함께 넣고 달여 마신다고 한다.
비단 이러한 황촉규의 효능은 동아시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파푸아 뉴기니아나 피지 등지에서는 황촉규의 잎이나 싹을 끓인 다음 감기를 치료하거나 편도선염이 있을 때 마신다.
배가 아프고 설사하는 경우에도 이 방법을 사용한다, 잎이나 싹 달인 물은 변비 치료에도 사용된다. 또 잎을 달여 피부에 발진이 났을 때에도 사용한다.
 |
||
| ▲ 황촉규는 원래 중국이 원산지라고 하며 우리나라와 일본 등지의 지역에서 주로 밭에서 재배하거나 자생한다. | ||
또 산모의 출산을 돕거나 유산을 시키는 경우에도 황촉규의 잎을 달이거나 우려낸 물을 마신다. 따라서 임신한 산모는 황촉규 물을 마시지 않도록 이 지역에서는 주의한다. 또 산모가 젖이 잘 나오지 않거나 월경과다에도 황촉규를 죽으로 만들어 마신다.
네팔에서도 활촉규 뿌리의 즙을 끓여 다친 상처 부위에 바른다. 삔 근육의 통증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한다. 감기나 기침이나 치통에도 황촉규 꽃을 달이거나 우려낸 물을 마신다.
최근 연구를 보면 황촉규는 신장염의 치료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효능이 있는 것에 착안하여 시작된 연구에서 황촉규를 투여 받은 신장염 환자들은 단백뇨 배설량이 줄고 소변량이 늘어서 신장염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동시에 이러한 효과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신장염 치료제와 비교하여 뒤떨어지지 않거나 일부 더 우수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실 천 년이 넘은 시간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 한지를 보면 한지의 제작과정에 필수적인 황촉규에 어떠한 의학적 효능이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사실 항암제를 비롯하여 진통제나 소화제 등 우리가 질병의 치료에 활용하고 있는 많은 약들은 자연으로부터 얻어진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자연이 준 혜택을 모두 활용하고 있지는 못하다. 황촉규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무한한 의학적 효능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앞으로 관심과 연구를 통하여 이를 밝혀낼 의무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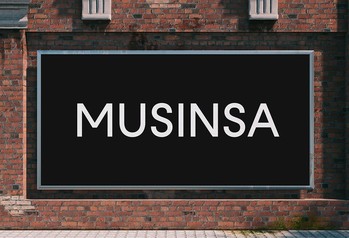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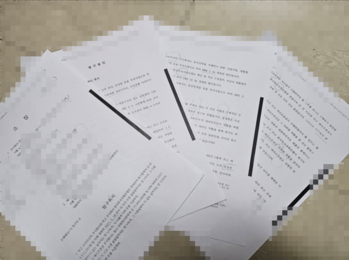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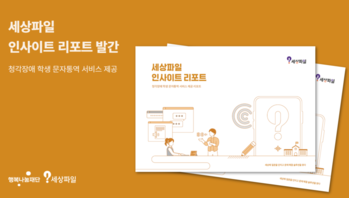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