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1974년 서울에 지하철이 개통 되면서 구걸하는 형태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역 주변에서 하던 구걸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하는 것이다.
이들을 앵벌이라 불렸다.
구걸을 하기위한 약 먹은 혀를 굴리며“차안에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꼬지꾼들의 일장 연설이 한참 듣다보면‘앵앵...’우는소리로 들렸기 때문이다.
생계형
돈?
그것은 자본우선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든 자유로울 수 없는 규범이다.
법과 제도의 통제에서 버림받아 나앉은 거리 또한 별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돈이 떨어지면 먹고 자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풍요가 넘치다 못해 쓰레기가 되는 첨단문명사회에서 생명에 대한 원시적인 위기를 느껴야 하는 것이다.
그래도 물배를 채우며 버티어보지만 보통은 3~4일이 지나면 자존심이고 뭐고 없다.
노숙부랑인들을 따라 무료급식소며 지원센터를 들락거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의 반복은 ‘인간답게’라는 의지력을 무력화시키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답습된 야비하고 무기력한 매너리즘만을 확인하게 한다.
그렇게 반복된 확인을 통해 거리에 알맞은 개체로 재생산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젊은이들은 장애노숙부랑인들에겐 좋은 파트너가 된다.
어떠한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든 신체적 열악함을 대신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담배며 술, 밥 등을 사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한다.
시간이 지나면 미안해서라도 앞방, 뒷방 하는 역할분담으로 앵벌이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지나면서 반복되는 학습과 사회적 무관심에 의한 고립감에 도덕적 바로미터가 무너진 젊은이들에게 주도권이 넘어 간다는 것이다.
그래도 크게 동요하거나 뭐라 하는 사람은 없는 것은 신체적 열등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붙어 다니는 동안은 똑같이 먹고 생활해야 한다는 묵계적인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지역이라도 요일별, 시간별, 조별로 나눠서 하고 일정기간동안 다른 지역 패거리들과 아예 구역을 바꿔서 벌이를 한다.
CCTV나 지하철이용객들의 신고나 제보로 인해 신변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형
하지만 배고픔을 충족한 앵벌이는 축적과 착취란 자본우선주의경제개념을 벤치마킹한 사업이 된다.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앵벌이 경험이 있는 젊은이들이 독단적으로 조직적하여 지능적으로 행사하는 감금, 갈취, 매춘, 협박, 폭행 등의 범죄행위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위장하기 위해 일자리를 구한다.
큰 기술 없이도 취직 할 수 있고 정리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배달 등을 하는 일자리들이다.
그리고 앞방, 뒷방을 해본 경험으로 구걸을 내보낼 꼬지 꾼을 물색한다.
여성장애노숙인, 남성장애노숙인, 가출청소년이나 가출여성 등의 순서다.
그래도 가출청소년이나 가출여성들은 부담스럽다.
환각제를 먹이고 폭력과 협박에 감시를 한다 해도 도망쳐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현력이 뒤떨어진 장애여성노숙인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노숙할 때 친분이 있는 장애여성이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의하는 정도면 목적한 곳으로 유인하기엔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유인하는데 성공하면 온갖 감언이설을 동원, 혼인신고를 하고 짭짭한 수입을 기대하는 교육으로 설득과 감금, 협박, 폭력 등을 행사한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온갖 폭력에 동화된 장애여성노숙인은 남편을 부양해야하는 의무감으로 앵벌이를 나서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부부관계로 생긴 아이 또한 앵벌이용이다.
출산 전엔 배부른 채로 출산 후엔 갓난쟁이를 등에 업힌 채로 앵벌이를 시킨다.
그래서 장애여성노숙부랑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번의 이혼 경력에 이름만 기억하는 자식이 보통 2~3명씩인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알았다 해도 이미 때는 늦은 것, 도망은 생각 할 수도 없다.
앞방 뒷방 하는 이들이 잠자는 시간 빼고는 붙어 다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용케 도망친다 해도 표현력에 한계가 있는 이들이라 소통에 귀기우려 주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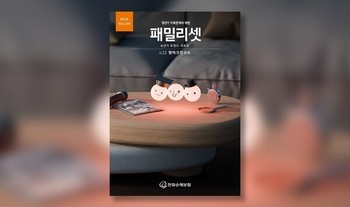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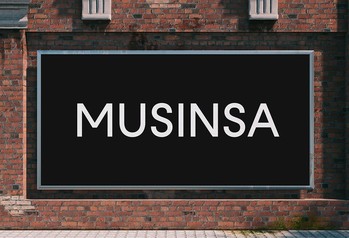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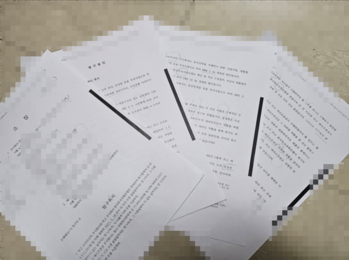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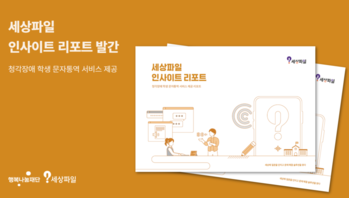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